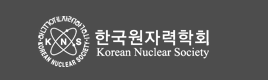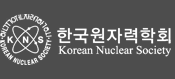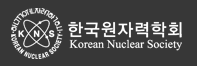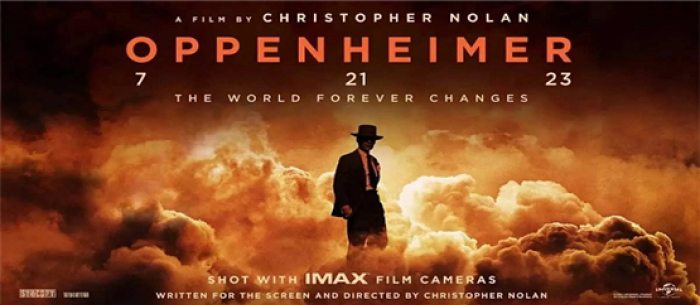
올 여름 극장가에서 제법 흥행을 한 영화라면 오펜하이머를 들 수 있겠다. 3백2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9위를 차지했다. 오펜하이머는 8월15일 광복절에 개봉했다. 오펜하이머는 원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이 원폭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8월15일 개봉은 묘한 여운을 준다. 또한 마침 이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만만치 않은 반일 여론이 팽배하던 시기여서 여러모로 묘한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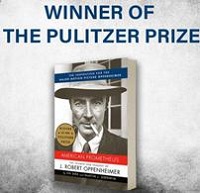
영화 오펜하이머는 ‘배트맨’, ‘인셉션’, ‘던커크’ 등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으로 2006년 퓰리처상을 받은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그린 ‘American Prometheus’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불을 인간이 쓸 수 있게 해준 신이다. 오펜하이머가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실증해 보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유한 제목이 아닌가 한다. 영화는 아이슈타인과의 만남과 이를 지켜봤던 당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루이스 스트로스가 오펜하이머에 가졌던 오해와 오펜하이머를 둘러싼 매카시즘 논쟁을 배경으로 맨하튼 프로젝트의 여러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오펜하이머는 1950년대 매카시즘의 바람 속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미국 과학계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당하고 1967년, 6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967년에 오펜하이머가 서거했을 때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풀브라이트는 오펜하이머가 미국을 위해서 한 일 뿐 아니라 미국이 그에게 저지른 일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안위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오펜하이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연설을 한다1) 그러나 그의 명예는 바로 작년 12월 미 에너지부가 오펜하이머의 사상을 의심하여 내린 미국원자력위원회의 1954년 비밀정보 접근금지를 68년 만에 취소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진실은 거짓에 언제나 승리한다고 하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2) 라는 말이 있듯이 오펜하이머 사후 55년 만에 승리한 진실을 정의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는 루이스 스트로스의 상무장관 임명 청문회를 발단으로 오펜하이머의 행적과 맨하튼 프로젝트의 과정을 보여준다. 원폭 개발을 위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를 건립하는 과정, 수소폭탄 개발을 두고 에드워드 텔러와의 논쟁, ‘트리니티’라고 붙인 최초의 원폭 실험, 실험 성공 후의 과학자로서의 흥분과 보통 사람으로서의 불안이 교차하는 장면 등을 보여준다. 아이슈타인이 발견한 물질-에너지 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물리학자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핫 이슈였으며 동시에 제2차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게임체인저로서 군사적 이용을 위한 경쟁의 대상이었다. 과학자로서 이런 아이러니를 마주하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펜하이머가 트루먼 대통령을 마주하는 장면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원폭 개발을 치하하기 위해 그를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오펜하이머는 “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라고 하며 원폭을 개발한 죄책감을 고백한다. 이에 트루먼은 “누가 폭탄을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폭탄을 떨어뜨렸느냐는 것이야.” 하면서 오펜하이머를 내쫓는다. 트루먼에게 오펜하이머의 고백은 자신이 겪었던 고뇌의 한 조각 거리도 되지 않았기에 오펜하이머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고백에 대다수 과학자는 공감할 것이다. 과학의 발로는 호기심이다. 그러니 과학자는 그들의 발견과 발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윤리적인 고민을 하기에 앞서 과학적 탐구에 몰입한다. 연구는 결과의 활용보다 神만이 알고 있던 지식의 창고를 열어젖히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오펜하이머는 물론, 아인슈타인 등 원자폭탄의 발명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여했던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에 반대하는 활동3)을 했다는 것은 과학자로서의 탐구적 단면과 보통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E=mc2’4)로 표현되는 아인슈타인의 물질-에너지 등가의 법칙도 신의 영역에 있던 지식을 인간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공식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원폭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당시 물리학자들의 추정이었다. 오펜하이머는 이를 증명했고 그로써 제3의 불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한 프로메테우스가 됐다. 불행하게도 이 증명으로,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 간을 쪼이는 고통을 받았듯이 오펜하이머도 한 편으로는 신의 세계를 엿본 희열을 느꼈을 것이나 한 구석으로는 그가 증명한 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번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과학자는 신의 숨겨둔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 준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줬듯이. 그러나 인간이 그 불을 악의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프로메테우스가 받은 고통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의 발견과 기술의 진전은 종종 양날의 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원자력뿐 아니라 의학의 혁신이라는 줄기세포도 그렇다. 불치의 병도 낫게 할 수 있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을 만들 수도 있다. 오늘날 과학 혁신의 총아라는 인공지능도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 의회가 IT계의 거물들을 불러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5)한 것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주목한 것이다. 오펜하이머의 고뇌는 다행히도 페르미가 원자핵 분열이 원폭으로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오늘날 원자력발전으로 이어져,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았나 싶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과학자의 숙명을 보여준다.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의 도움으로 긴 고통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나, 영화는 여기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마치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의 숙제인 것처럼….
오펜하이머는 지루한 영화다. 하지만 과학자는 물론 원자력에 종사하는 학회 회원들이 한 번쯤 보고 양면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하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영화다. 더구나 우리는 파멸의 상징인 원폭으로 등장한 원자력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환의 시대에 있다.
1) 1967년 오펜하이머 서거시에 미국 상원에서 풀브라이트 의원이 행한 연설 발췌: “Let us remember not only what his special genius did for us; let us
also remember what we did to him.” Today we remember how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reated a man who served it with the highest distinction.
We remember that political motives have no proper place in matters of personnel security. And we remember that living up to our ideals requires
unerring attention to the fair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our laws.
2) 라틴어 원문은 LEX DILATIONES ABHORRET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다.
3) 아인슈타인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같이 1955년 핵무기의 폐기와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주창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했고, 오펜하이머도
원폭의 확산을 우려하며 수소폭탄의 개발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는 영화에서 수소폭탄이 가능함을 제시한 에드워드 텔러와의 갈등으로도 잠시 묘사된다.
4)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이다.
5) 2023.9.13., 미국 상원은 Facebook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구글 CEO 순다 피차이, ChatGPT를 개발한 OPEN AI CEO 샘 알트만, Microsoft CEO 산티아 나델라,
Tesla와 Space 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미국 Tech. 산업의 거물들을 불러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논했다고 한다.
https://www.cnbc.com/2023/09/13/musk-zuckerberg-among-tech-leaders-visiting-senate-to-speak-about-ai-.html
에필로그: 필자가 30여 년 전 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잠시 일할 때 수소의 Cross-section data가 필요해서 Los Alamos 연구소와 연락한 적이 있다. 그때 수소 데이터는 Y12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이하다 싶어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Y12가 영화에서 핵물질을 만들던 시설로 나와서, 오래된 의문이 하나 풀렸다. 그때 수소의 데이터는 받지 못했지만….